명불허전(名不虛傳), 이름은 그냥 나는게 아니었네
잘 만든 ‘웰 메이드 공연’ 정신혜무용단 ‘굿·good Ⅱ’
- 내용
올 한해 부산 무용계를 가장 뜨겁게 달군 정신혜 무용단이 지난 18일 저녁 7시30분 부산진구 연지동 국립부산국악원 연악당(대극장)에서 ‘2011 창작춤 공연-‘여섯갈래의 길’ ‘굿·good Ⅱ' ’을 열었습니다.
이번 공연은 이날 선보인 레퍼토리이기도 한 ‘굿·good Ⅱ'이 국내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제32회 서울무용제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기념으로 마련된 것입니다. 서울무용제는 춤계에서는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무용제입니다. 타이틀이 ‘서울’무용제일 뿐 전국의 이름난 춤꾼들이 기량을 겨루는 우리나라 최고의 춤 축제입니다.
경연 방식으로 치르는 무용제인 서울무용제의 문턱은 높기로 유명합니다. 서울무용제에서 지방무용단은 번번이 입상의 문턱에서 고배를 마셨습니다. 공정성을 최고 권위로 내세우는 무용제인만큼, ‘지방’단체라고 해서 특별한 인센티브를 주지않기 때문이지요. 오로지 실력으로 우열을 가리는 무용제에서 그동안 지방의 무용단체는 서울과 지방의 실력차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콧대 높은 서울무용제의 높은 벽을 부산의 정신혜무용단이 단박에 넘은 것입니다. 그것도 ‘우수상’이라는 아주 훌륭한 성적으로 말입니다. 정신혜무용단은 서울무용제 수상에 이어 2011 대한민국무용제 베스트 7 선정되며 올 하반기 부산 문화계에서 가장 HOT한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오로지 실력만으로 서울 입성에 당당하게 성공했다는 자신감이 넘쳐서 였을까요? 공연은 한 치의 모자람도 없이 빼어나게 훌륭했습니다. 춤꾼들의 동작은 여느 때보다 힘찼고, 에너지가 넘쳤습니다. 무대와 혼연일체가 되어 마치 블랙홀처럼 관객들의 넋을 무대로 빨아들였습니다.

첫 작품 ‘여섯갈래의 길’은 불교의 윤회사상을 춤으로 표현했더군요. 무대 연출은 퍽 단순했습니다. 우주 삼라만상 혹은 만다라를 연상시키는 흰색 원형 테이블이 하나 놓여있을 뿐입니다. 서서히 조명이 켜지면서, 꿈틀대는 작은 움직임이 시야에 들어옵니다. 회색 천으로 몸을 친친 동여맨 무용수들입니다. 모두 여섯 명이네요. 원형 판을 힘겹게 기어오르는 무용수들은 천천히 판을 내려온 후 어둠 속으로 사라집니다. 회색 천으로 몸을 감싼 무용수들의 모습은 애벌레 같습니다. 어찌 보면 억겁의 실타래에서 빠져나와 가쁜 숨을 몰아쉬다 다시 윤회의 수레바퀴 속으로 들어가는 인간의 슬픈 숙명인 것처럼도 보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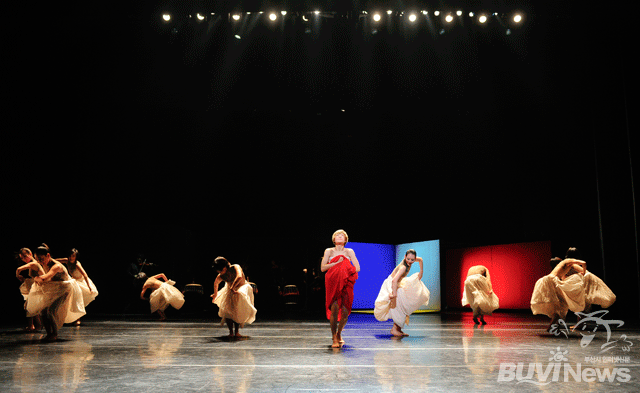
윤회의 수레바퀴를 힘겹게 빠져나온 여섯 마리의 애벌레들이 사리진 후 붉은 의상을 입은 한 명의 여성 무용수가 등장, 좁은 원형 판위에서 춤을 춥니다. 좁은 공간에서 웃고, 울고, 분노하고, 절망하며 몸부림치고, 절규합니다. 보이지 않는 유리벽을 타고 오르기 위해 애쓰다 좌절합니다. 생의 수레바퀴 아래에서 울고 웃으며 때로는 분노하고 몸부림치는 인간의 숙명을 표현한 것일까요. 처연하기 그지없습니다. 끝없는 윤회의 굴레를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여섯갈래의 길’은 관객에게 끝없이 질문합니다.
반전은 뜻밖에 찾아옵니다. 이동식 무대장치가 서서히 올라오면서 ‘반야심경’이 들려옵니다. 으레 녹음테이프려니 여겼는데 모습을 드러낸 이들은 서른 명 남짓한 스님들입니다. 반야심경을 들은 무용수는 고른 숨을 내쉬며 윤회의 수레바퀴에 몸을 맡깁니다. 그리고…암전. 해탈은 어떻게 이뤄질까요? 가없는 질문으로 ‘여섯갈래의 길’은 막을 내립니다.
공연 하아라이트였던 ‘굿·good Ⅱ’은 우리 굿에 담긴 민족정서의 원형질을 춤으로 표현한 작품입니다. 앞서 선보였던 ‘여섯갈래의 길’과 미학적 철학적으로 연계되는 작품이기도 하구요.
주인공은 “굿은 아름답다”고 읊조리는 무녀입니다. 샤기컷 헤어스타일을 한 신세대 무녀는 무대를 오가며 신이 인간에게 전하는 공수를 넋두리하듯 전합니다. ‘굿·good Ⅱ’의 메시지를 한 편의 시(詩) 혹은 독백으로 툭툭 던지는 것이지요. 무녀의 공수는 곧 춤으로 바뀌어, 굿의 한 판 과정을 춤으로 보여줍니다.
‘굿·good Ⅱ’은 아주 감각적인 공연입니다. 빨강 노랑 파랑 검정 하얀 색 등 오방색을 무대장치에 과감하게 도입하고, 무가(巫歌)와 서양 집시음악을 절묘하게 교차시킵니다. 가벽만 세운 무대장치는 조명의 변화만으로도 무대에 충분한 깊이를 부여했습니다.
‘굿·good Ⅱ’은 미학이니 춤의 구성요소니 하는 책상머리에서 하는 언어를 무색하게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언어가 없는)춤은 어렵다’고 합니다. 좀더 솔직하게 말하면 “재미없다”라는 것이 본심일 터인데요, ‘굿·good Ⅱ’은 이런 편견을 단숨에 날려줍니다. 전통춤의 원형은 간직하되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춤의 영역을 한껏 넓힌 안무는 독보적이었습니다. 전통춤이 현대무용에 견주어도 결코 뒤지지 않는 몸의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도 훌륭하게 증명해낸 것이지요.
‘굿·good Ⅱ’에는 경계가 없습니다. 현대무용인 듯 하다보면 춘앵무의 동작이 보입니다. 무대를 휘어잡는 젊은 무녀의 맨발에서 흰색 버선코의 갸름한 선들이 환영처럼 보입니다. 전통과 현대를 그야말로 거침없이 넘나듭니다.
상상력도 거침없습니다. 군더더기를 없애고 가벽만 세운 무대장치는 단순해서 경계가 없더군요. 조명의 색깔과 밝기만으로 생사고락으로 질퍽대던 삶의 장마당은 금새 시퍼렇게 날선 작두가 되기도 하고, 삶의 쇠창살이 되기도 합니다.
‘굿·good Ⅱ’을 만든이는 부산의 젊은 안무가 정신혜(신라대 교수)입니다. 삼십대 후반의 젊은 춤꾼은 ‘굿·good Ⅱ’에서 나이를 무색케 하는 실력과 나이를 뛰어넘은 상상력으로 무대를 쥐락펴락합니다. 안무는 물론 연출, 조명, 무대연출까지 깊이 관여해 자신만의 색깔을 드러낸 그이의 실력이 놀랍습니다.
그는 무대를 갖고 놀 줄 아는 춤꾼입니다. 디테일한 춤 언어를 알지 못하는 문외한이라도 충분히 재미있게 보고 즐길 수 있는 ‘웰 메이드 공연’을 만들어냈습니다. 춤에 집중하다 주변을 놓쳐버리는 우를 범하지 않고, 영리하게 한 곳으로 수렴해내는 놀라운 기량을 선보였습니다. 앞으로 펼쳐 보일 춤 세계를 설레며 기다릴 관객을 만들어낼 줄 아는 춤꾼이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활동이 기대됩니다.
���������������������������������������������������������������������������������������������������������������������������������������������������������
- 작성자
- 김영주
- 작성일자
- 2011-12-21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 첨부파일
-
-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