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 그 자체로서 온전한 섬은 아닐찌니
해파랑길의 시작점 오륙도를 탐방하다
- 내용
추운 겨울날이라고 움추려 있기에는 너무 찬란한 햇살. 그래서 겨울바다로 가보았다. 해운대 광안리의 경계를 넘어 오륙도 바다이다. 고래가 품어 놓은 거친 숨소리처럼 바위위에 하얗게 부서지는 포말을 보고 있노라면 마음속 체증까지 다 실려 내려가는 느낌이다.
삼면이 바다인 우리 한반도에서 동해와 남해를 나누는 기준이 어딜까? 오륙도에 가 보면 특이한 표식이 하나있다. 바로 승두말이라고 오륙도를 바라보는 육지의 끝에 동해와 남해를 가르는 동판이 새겨져있다. 이곳을 기점으로 시작되는 동해. 그 상징물이라도 되듯 올해 2월1일 해파랑길 관광안내소가 전망 좋은 곳을 차지했다. 동해와 남해의 분깃점 승두말에서 시작되는 동해안 탐방로는 강원도 고성군 통일전망대까지 770.9km의 길을 이루게 된다.


부산의 갈맷길 조성으로 걷기 좋은 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는데, 해파랑길이 그 위에 얹혀지면서 섬처럼 떨어진 부산이 아니라, 동해안 전체를 관통하는 해안로로서의 부산의 갈맷길이 이미지를 변신하고 있다. 영국 작가 존던 (John Donne)의 시에서처럼 '누구든 그 자체로서 온전한 섬은 아닐지니, 모든 인간의 대륙의 한조각이며 대륙의 일부분일 뿐'이다. 부산의 길도 한반도의 길의 일부이며, 떨어져 보이는 오륙도도 사실 대륙의 일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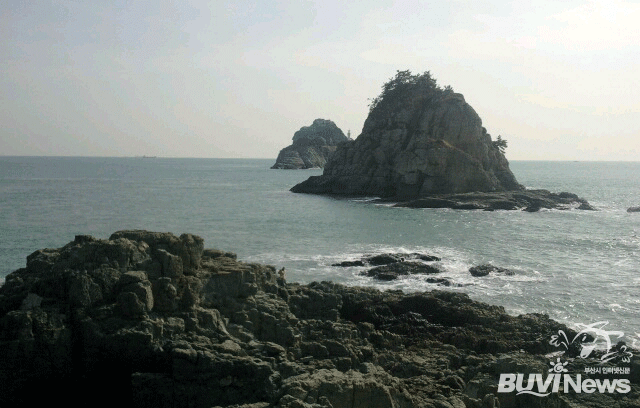

오륙도 앞바다까지 와서 삶의 고독을 씹어 삼키는 파도속에 회한을 풀어보지만, 정호승 시인의 말처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그렇게 섬처럼 뚝뚝 떨어져 사는 것 같지만, 사실 모두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갈맷길을 오르내리는 등산객들도, 갯바위에서 낚시를 늘어뜨리는 강태공들도, 차를 주차하고 커피를 마시는 관광객들도 모두 바다앞에서 겸손해지는 곳이다. 전망대의 투명유리사이로 펼쳐지는 이기대와 오륙대를 조망해도 좋겠고, 찬 바람 그대로 맞으며 갈맷길을 올라봄도 좋을 듯하다.
����������������������������������������������������������
- 작성자
- 김광영/부비 리포터
- 작성일자
- 2013-02-12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