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얀 목화 꽃 솜’ 부산서 보다
- 내용
요즘 농촌에서도 볼 수 없는 ‘목화 꽃과 솜‘이 부산 대연동 수목원 남쪽 끝 허브와 함께 자라서 목화 꽃을 피웠다. 처음은 하얀 꽃이 점점 붉은색으로 변하면서 작은 솔방울 같은 열매를 맺고 열매에서 하얀 솜이 뽀송뽀송 피어났다. 목화 풋 열매는 사람이 먹으면 달콤해서 필자는 산골에서 자랄 때 목화열매를 따 먹었다.
현재 자라고 있는 목화밭은 밭이라고 하기엔 너무 초라하지만 분명 목화 20여 그루가 모여서 허브 밭 박하들과 어께를 나란히 하고 서로 잘 보이려고 넝쿨 속에서 영치기영차를 하고 있다. 이 목화는 우리조상들에게는 따뜻한 옷감과 겨울용 이부자리 속감으로 농촌 가정에서는 필수품으로 소중했다.

그리고 요즘같이 화학섬유 질이 없을 때 농촌에서는 어느 집이든 목화를 심지 않은 가정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그만큼 옷감을 만드는 천이 귀한 때이기에 목화를 심어서 목화나무에 매달려 있는 뽀송뽀송한 솜을 따서 잡티를 제거하고 목화씨를 발라내는 수동식기계틀에 넣고 손잡이를 돌리면 씨앗은 앞으로 떨어지고 하얀 솜은 뒤로 떨어진다. 일명 쐐기라는 기계로서 조상들의 지혜는 대단했다.
이 솜으로 무명옷을 만드는데 우리 할머니`어머니들의 길쌈실력에 따라 우리들이 입고 다녔던 교복도 나오고 할아버지`아버지의 무명옷이 만들어 진다. 하도 오래되어서 만드는 과정은 가물가물한데 대략 설명을 하자면 목화씨를 발라낸 하얀 목화를 활 같은 것으로 목화를 탄다는 것으로 기억을 한다. 목화를 탄 것을 씰 타래 같이 무릎위에 놓고 돌돌 말아서 물레로 무명실을 뽑아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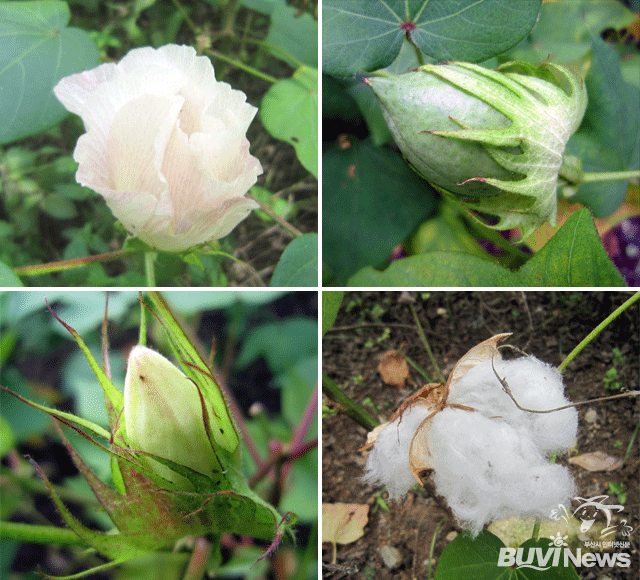
뽑아낸 실을 시골마당 바람이 불지 않은 날 한필 길이로 배틀 한바대 넓이로 날아서(실을 펼침) 무명옷감을 짠다. 배틀은 아직 농촌에서 볼 수 있는데 정말 귀한 기계이다. 필자어머니가 무명옷 한필 짜는데 밤낮으로 몇 날을 짜는 것을 보았다.
짜는 요령은 손과 발 그리고 눈 온몸으로 배를 짠다. 손으로는 실타래를 담은 북을 좌우로 흔들고 발을 사용해서 당기면 바대가 올라가고 배틀 위에 있는 실은 가운데 쩍 벌어진다. 그러면 북을 사용해서 골 사이로 넣어서 반대로 뺀 후 손은 바대를 앞으로 잡아당긴다. 이과정이 무명실 한 올 을 짜는 것으로 배 한필을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짠 무명천은 옷이 된다.
이런 소중한 목화밭이 도시의 눈에 넣어도 모자랄 귀퉁이에서 목화가 자라고 있는 것을 보고 필자는 이 나무가 목화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발견을 하고 사진을 찍었지 농촌 출신이 아니면 이것은 나무도 아닌데 꽃이 핀다, 라는 말만 하고 있다.
한편 중년 아주머니 한분이 사진을 찍는 과정을 보더니 아저씨 그게 뭔데요, 라고 한다. 목화 아닙니까? 라고 하니 열매 따 먹던 기억을 하면서 이것이 목화가 많네, 라고 한다. 도시아이들은 목화가 뭔지 유치원선생님들도 목화나무를 모르고 지나간다. 필자에게 묻던 아주머니는 남원이 고향이라서 목화를 알고 있었다.
�����������������������������������������������������������������������������
- 작성자
- 황복원/부비 리포터
- 작성일자
- 2012-09-11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